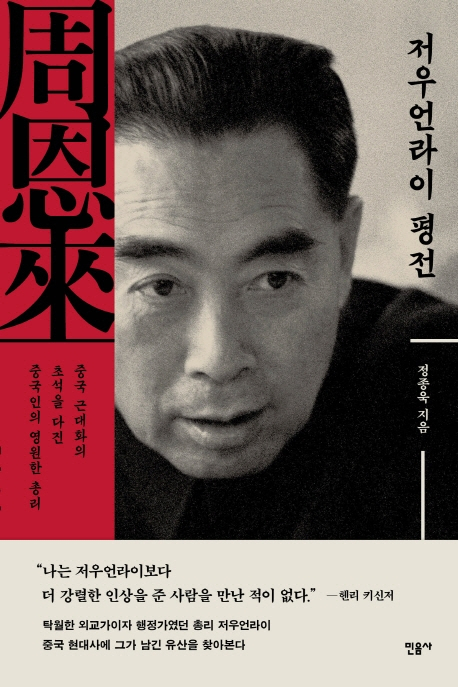
저우언라이 평전
정종욱 지음
민음사
북한 함흥의 흥남 비료공장 앞에는 저우언라이(周恩來) 동상이 서 있다. 북한 유일의 외국인 지도자 동상이다. 1958년 2월 저우의 함흥 방문을 동행했던 김일성의 배려다. 함흥에는 당시 한국전에 개입했던 중국 주둔군 본부가 자리했다. 저우는 중국군 철수를 매듭짓고자 함흥을 찾았다.
1972년 3월 7일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 1주일 뒤 저우는 다시 평양을 방문했다. 미·중 데탕트에 당시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 알바니아는 중국을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달랐다. 키신저 효과였다. “닉슨이 재선되면 임기 전 한반도에서 미군이 모두 철수할 수도 있다.” 저우는 키신저의 말을 김일성에게 직접 전했다. 다시 1975년 4월, 김일성은 베이징에 1주일간 머물렀다. “잃을 것은 군사 분계선이요 얻는 것은 통일”이라며 제2의 남침에 동참을 요구했다. 말년의 마오쩌둥(毛澤東)과 저우는 반대했다.
이 책이 밝힌 저우와 북한의 끈끈한 인연이다. 저우는 당 중앙 군사위 부주석으로 한국전에 깊숙이 간여했다. 6·25 발발 한 달 전 김일성은 베이징을 찾았다. 스탈린의 지시였다. 마오와 저우를 만난다. 언쟁이 오갔다. 김일성은 스탈린이 남침 계획을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저우는 그날 밤 로시친 소련 대사를 불러 따졌다. 중국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한 데 대한 노골적 불만이었다. 이튿날 스탈린은 중국이 반대하면 김일성의 남침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단 중국은 뒤집을 힘도, 의사도 없었다.
연합군의 반격으로 전황이 급변했다. 중국이 개입을 결정한 사흘 뒤인 10월 8일 저우는 소련으로 향한다. 참전의 전제 조건인 소련의 공군 지원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스탈린은 지원을 거부했다. 12일 저우의 전보를 받은 마오는 주저했다. 그래도 중국이 참전하면 미군이 진격을 멈출 것으로 예단했다. 출이부전(出而不戰)을 노렸다. 미군 아닌 한국군을 첫 공격 대상으로 삼은 이유다. 미국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북·중 ‘항미원조’ 논리의 실상이다.
저우언라이는 3대 주중대사를 역임한 저자에게 평생의 화두였다. 왜 저우는 “인민의 소가 아니라 마오의 소”라는 비판에도 굴욕을 감내했을까. “저우는 현대 중국의 마지막 스예(師爺)였다.” 저자가 찾은 해답이다. 저우언라이 집안은 대대로 스예를 지냈다. 막우(幕友)로도 불린 스예는 조선의 아전·서리와 같은 지방의 정치 자문역이었다. 일종의 직업 선비다. 선비는 주군을 따라야 했다. 마오와 저우의 비대칭 관계의 뿌리다. 1935년 쭌이(遵義) 회의에서 최고 지도부였던 저우는 하급자 마오의 일인자 등극을 도왔다. 1976년 숨질 때까지 저우에게 마오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됐다.
중국의 지도자가 마오를 닮으려는 시대다. 이 책은 제2의 저우언라이를 찾아온 지중파 원로가 중국과 이웃해 살아가야 할 후세에 전하는 잘 다듬어진 선물이다.
신경진 중국연구소장 shin.kyungjin@joongang.co.kr
기사 및 더 읽기 ( 저우언라이 행적에서 드러난 ‘항미원조’의 진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
https://ift.tt/2TBPBga
세계
No comments:
Post a Comment